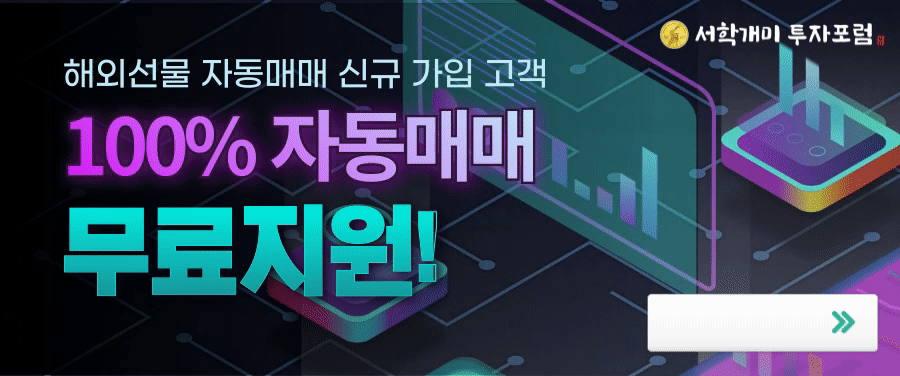디파이, 성능 우선의 진화: '최소 실행 가능 탈중앙화(MVD)'를 통해 새로운 가능성을 열다

디파이(DeFi)의 발전이 중앙화 금융 시스템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주력하고 있지만, 실제 거래자들의 요구는 여전히 충족되지 않고 있다. 현실적으로 디파이가 전통 금융(TradFi)의 대안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이념보다는 성능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최근 부각되고 있는 '최소 실행 가능 탈중앙화(Minimum Viable Decentralization, MVD)' 개념은 검열 저항성과 거래 안정성을 유지하며, 거래자 친화적인 환경을 구축하는 방법으로 주목받고 있다.
디파이는 본래 중앙화 시스템의 문제를 해결하는 철학에서 출발하였다. 허가 없이 접근 가능한 구조와 검열 저항성은 이 시스템의 핵심 가치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그러나 이더리움(ETH)과 같은 주요 블록체인의 블록 생성 시간이 12~15초에 달하는 현실은 고빈도 매매(HFT)와 같은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대표적인 탈중앙화 파생상품 거래소인 디와이디엑스(dYdX)가 자체 체인으로 이탈한 주된 이유도 여기서 찾을 수 있다.
게다가 MEV(최대 추출 가능 가치) 문제는 기존 사용자 신뢰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블록 생성자가 거래를 우선적으로 처리하거나 거래 사이에 끼어들어 가격을 왜곡시키는 행위는 유저의 신뢰와 거래 품질을 저하시킨다. 이러한 문제는 단순한 기술적 결함이 아닌 가격 효율성과 체결 신뢰성을 저하시키며, 숙련된 거래자들이 사실상 시장에서 배제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따라서 철학적인 접근이 아무리 탁월하더라도 이를 뒷받침할 인프라가 부족하면 스스로 한계를 드러내는 셈이다.
현재 최상위 거래자들이 요구하는 조건은 분명하다. 밀리초 단위의 거래 성능, 높은 안정성, 예측 가능한 체결 속도 등이 그 예다. 디파이가 트래디파이에 필적하기 위해서는 블록 생성 속도가 100밀리초 이하, 거래 최종 확정이 1초 이내이며, MEV 보호가 기본으로 제공되고 시스템 가용성이 99.999%에 달해야 한다. 이러한 요구를 단순한 탈중앙화의 가치만으로는 충족할 수 없다.
해법으로 제시되는 MVD는 탈중앙화를 전부 또는 무(無)로 나누는 기존의 이분법적 사고에서 벗어나 최소한의 탈중앙화를 유지하며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전략이다. 검열 저항성과 신뢰 기반 거래 환경을 유지하면서도 속도, 체결력 및 확정성을 사용자 경험의 중심에 두는 접근법이다. 현재 많은 차세대 블록체인들이 이 원칙을 기반으로 하여 검증자 집합의 간결화, 병렬 처리 합의 구조, 빠른 확정 시스템 등을 실험하고 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이 중요한 이유는 현재 디파이 사용자층과 거래량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파생상품 분야는 급속한 성장이 예상된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디파이 파생상품 시장은 2031년까지 누적 거래금액이 351조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연평균 성장률은 138%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하이퍼리퀴드(Hyperliquid)와 에보(Aevo) 같은 선도 플랫폼이 초기에 괄목할 성과를 내고 있지만, 이들 역시 1층 체인 한계와 롤업 지연성 등 기술적 제약에 직면하고 있다.
이러한 제약을 극복하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이념만으로는 부족하다. 디파이가 나아갈 다음 단계는 '순수성'이 아닌 '실용성'에 초점을 맞춘 탈중앙화가 필요하다. MVD는 이상과 실현 가능성 간의 균형을 찾는 첫 걸음이자, 유저의 신뢰를 확보하면서 실제로 작동하는 금융 시스템을 구축하는 실용적 대안이다. 앞으로의 디파이는 최소한의 탈중앙화 기반에서 최대의 거래 가능